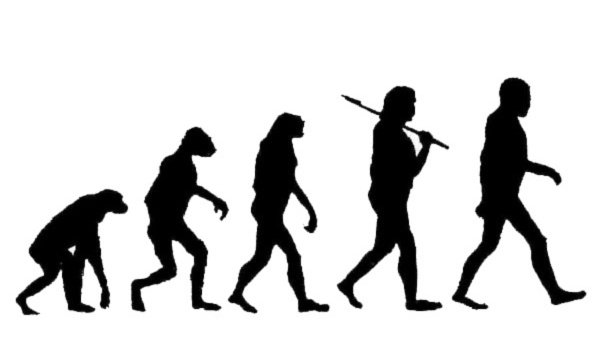
곰곰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존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이 실로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기적인 삶의 욕구 역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머나먼 미지의 과거에 발생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원은 한정적이었고 삶은 불확실했다. 우리는 남보다 먼저 자원을 확보해야 했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남의 것을 빼앗아 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이기적 유전자’의 운반체인 우리에게 이기심은 마땅한 본성이었으며, 궁핍한 목숨과 목숨 사이에 이타심이 끼어들 틈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 우리는 어느날 기적처럼 혼자보다 둘이 생존에 유리함을 깨달았고, 둘보다는 셋이 유리함을 깨달았다. 집단은 한 개인이나 보다 작은 집단을 제거하고 자원을 갈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집단의 생존은 곧 개인의 생존으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특질,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타인의 생각을 가늠하는 지능을 개발해 나아갔고, 이 같은 능력은 즉 이타심으로 귀결되었다. 남을 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존, 정확히는 내 유전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역설적 운명을 갖게 된 것이다.
한데, 가만보면 우리의 이 역설적 운명도 참으로 얄궂은 데가 있다. 분명 이는 비극과도 같이 아름답고, 이를 실행함은 우리를 자못 우쭐한 기분에 빠지게도 하나, 다정도 병이라 이에 지나치게 심취함은 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여차저차 설명을 늘어 놓아본들, 본질적으로 이타(利他)란 자원을 양보함으로서 생존에 불리함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롯한 도덕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희생할지의 문제이며, 더 큰 희생을 감내할수록 더 큰 가치를 갖음이 보통이다. 당연히 극에 달한 이타심은 생존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말하자면, 현실의 생존은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줄타기로, 우리의 역설은 사실 이기(利己)와 함께 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타심 역시 아무런 제약없이 작동하는 화수분이 아니었다.
첫째로, 우리의 이타심에는 ‘상호 호혜’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른바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이다. 이는 계속된 죄수의 딜레마 실험에서 가장 유리한 생존 전략으로 입증된 ‘팃포탯(tit for tat)’ 전략과 맥이 닿아 있는데, 먼저 호의를 베풀지만 배신행위를 한 상대에게는 더이상 협력하지 않고 배척한다는 것이다. 혹여 인류애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고결한 심성에 이러한 저열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이타주의가 실재하는 방식이며, 날개가 없어 추락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의 한계처럼 우리 마음에 지워진 굴레이다. 아무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더라도, 상대의 뻔뻔함을 경험하고도 계속 선의를 베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보복이 전제되지 않은 순수한 이타주의는 절대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ESS)’이 아니어서, 속되게 일러 호구가 되기 십상이고 그 삶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만든다. 가령, 혹자는 군대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니 모든 군대를 해산하면 인류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희망할 수 있겠지만, 실상 이는 악인의 출현을 막을 방법을 스스로 버림으로써 그 악(惡)을 제외한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최악의 전략이다. 순수한 이타주의는 오로지 저열한 호혜적 이타주의자들의 사회 속에서 빛날 수 있을 뿐이며, 모순적이게도 우리 삶은 저열함으로써 고결함을 지켜내는 모양새인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이타심에는 모호하고 가변적이지만 반드시 경계가 있다. 이타심이란 본래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을 위해 발전한 성질인 탓에, 경계를 두어 차등적으로 작용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종교의 가르침은 이교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권을 주장하는 운동가들은 늘어난 개체수를 조절하는 일을 ‘인도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꼭대기로 삼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계단처럼 층층이 차별의 울타리를 친 채로 사랑을 입에 담는 셈이다. 극단적인 윤리성을 추구하는 채식주의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집에 앉아 먹는 식물들도 결국은 동물들을 몰아내고 농장을 지어 생산된 것이며, 담을 쌓고 해충을 구제하여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결과물이다. 혹여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농장을 폐쇄하고 아주 도덕적인 채집생활만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류는 신석기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 식량 생산량으로 인해 인구 대부분에게 ‘인도적’ 안락사를 선고해야만 한다. 자원이 필연히 한정된 상황에서 풍선의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바꾸어 생각하면, 인류 밖 외집단을 향한 도덕심은 인류 내집단 구성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심과 같으며, 때로는 타인에게 문명이 주는 안녕을 포기하라는 폭력과도 같다.
이처럼 한계없는 이타심나 경계없는 이타심은 삶에 불리한 것이어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어떠한 도덕적 명제도 한계와 경계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계와 경계를 정하지 않은 도덕은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도덕을 과연 도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도덕을, 안으로만 싸고도는 도덕을 우리는 도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길을 피할 도리가 없으며, 도덕을 추구할수록 필히 더 큰 위선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이 모순을 외면할 뿐이며, 자신이 도덕적이기로 마음먹은 만큼까지만 도덕적일 따름이다.
물론 그렇다고 위선을 혐오한다는 같잖은 명목으로 이타심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 우리는 서로를 도와 함께 역사를 만들었고, 그 한계와 경계를 깨 나가며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기심만을 앞세우면서 합리적인 개인주의로 포장하고 똑똑한 체하는 태도는, 죽어가는 몸은 보지 못한 채 증식해 나가는 암세포와 다르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름다운 역설과 그것이 내포한 더러운 모순 아래, 위선자와 파렴치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셈이다. 때론 위선자로 몰려 조롱당하고 때론 파렴치한으로 찍혀 모멸받으면서, 또 그렇게 타인을 조롱하고 모멸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선자가 될지, 혹은 어느 정도의 파렴치한이 될지, 참으로 가혹한 선택지 속에 조심스럽게 생을 영위하고 있다.
살아가는 것은 폭력이죠. 우쨨든 덜 폭력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길 밖에 없지요. 저는 그게 조화로운 삶인것 같습니다. 졸라리 어려운,
이제 조금씩 글빨시동?
저도 그것이 졸라리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끄적여 보았습니다ㅎㅎㅎㅎㅎ 착한 척할 수록 욕하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는 무단횡단도 안하냐? 거봐 똑같은 주제에 착한 척하기는” 같은 비아냥이죠. 그런데 또 뻔뻔함보다는 위선을 택하리라 생각하다가도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고 싶어지니, 정말 졸라리 어렵습니다ㅎㅎㅎㅎ
이타심의 상호 호혜까지는 어떻게든 이해가 좀 되는데, 사실 모호한 경계 부분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이 어디까지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텐데, 이 정당한 몫이라는게 몇 사람만 모여도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 문제가 되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된 사회나 조직.. 까지도 아니고 실제는커녕 이론적으로 저걸 정립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역설과 모순을 인지하는게 인간의 종특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이 좋아져버린 두뇌 탓이겠죠?
그러니 선과 악을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래서 선악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만큼 무용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에서야 읽는 sleeprince님 글. 이거 저의 믿음과 신뢰와 삶의 방식의 큰 축인데 ; 저열한 계산이 깔려있는 걸 들켰군요. 저만 모순적인 게 아니라 인류 자체가 삶 자체가 모순이니 저에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D ㅋㅋ
사람이 다 똑같죠ㅋㅋ 바람직하십니다.